벽절에 쌓은 고려의 유일한 전탑
5월 6일 일요일에 ‘삼사순례’에 나섰다. 아침 6시에 집을 나서 7시에 오대산 상원사, 월정사를 거쳐 여주 신륵사까지 돌아보는 일정이다. 하루 만에 세 곳을 돌아온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여정이 아니다. 그래도 많은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절집 들이라는 것에 가슴이 벅차다.
마지막으로 들린 여주 신륵사. 남한강가에 자리한 신륵사를 예전에는 ‘벽절’이라고 불렀다. 봉미산 신륵사를 벽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신륵사 동편 바위 위에, 벽돌로 만든 다층전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다층전탑은 보물 제226호로 지정이 되어있다.
석탑보다 높이 쌓은 전탑
벽돌로 만든 탑의 경우 그 높이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석탑의 경우보다 전탑은 그 높이를 높이 세우는데, 이것은 벽돌을 쌓아 층을 올리기 높이를 높이는데 있어 수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높이가 9.4m나 되는 이 전탑은 돌로 만든 기단위에 여러 층의 벽돌을 쌓아올려 만들었다. 탑의 높이도 높지만 남한강 가 암벽 위에 자리하고 있어, 그 높이가 더 높은 듯 장중해 보인다. 화강암을 다듬어 쌓은 7단의 기단 위에 여러 단의 벽돌을 쌓아 탑신부를 만들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 전탑이기 때문에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손꼽힌다.
이 전탑은 얼핏 보기에도 신라시대 전탑보다는 섬세하지 못한 듯 보인다. 신라시대에 조성된 전탑들은 틈새가 거의 나타나지 읺는다. 그리고 벽돌을 촘촘히 박아 벽돌로만 쌓았는데 비해서, 이 전탑은 벽돌과 벽돌 사이를 띄워 그 사이를 점토로 채워놓는 방법을 택했다.
신륵사 다층전탑의 건립 시기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 전탑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것으로 보이며, 탑 북쪽에 있는 수리비 내용에 의해 이 탑을 조선조 영조 2년인 1726년에 고쳐지었음을 알 수 있다.
올 봄에 문화재를 만나보자
수많은 문화재들을 만나는 즐거움. 그리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경관. 그런 것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가을은 역시 여행에는 제철이다. 이러한 계절에 그저 편한 복장으로 훌적 차에 올라 길을 나서면, 어디를 가나 기다리고 있는 문화재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화재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가을은 이야기들이 더 풍요로운가 보다
석등을 벗어나 날아오르는 비천인들
여주 신륵사. 봉미산 신륵사라고 이름을 붙인 이 고찰은 신륵사라는 이름보다 ‘벽절’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곳이다. 남한강 변에 자리 잡은 신륵사 일주문에는 '봉미산 신륵사'라는 현판이 걸려있는데, 이는 이 고찰이 자리한 절이 봉의 꼬리라는 것이다. 그 봉의 머리는 바로 강원도 오대산이다.
신륵사 조사전 뒤에 보면 산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 신륵사 서북쪽으로 난 이 계단을 오르면 보물인 보제존자의 석종과 석등, 비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있다.

뛰어난 조각기법을 선보이는 고려시대의 석등
철책으로 조성된 보호대 안에 자리한, 보물 제231호인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 앞 석등>이란 명칭을 갖고 있는 석등은, 조각기법이 뛰어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석등은 대개 절의 전각 앞이나 부도탑 등의 앞에 세운다. 아마 두 곳 모두 불을 밝힌다는 뜻을 갖고 있나보다. 더욱 보제존자의 사리를 모신 석종 앞에 있는 이 석등은, 영원한 안식처로서의 부처의 세계로 가는 길을 밝힌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보물 제231호로 지정이 된 8각 석등은 불을 밝혀두는 화사석을 중심으로, 아래에는 간주석이 없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받침을 두었다. 위로는 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으로 구분이 되며, 받침돌에는 표면 전체에 꽃무늬를 가득 새겨 장식하였다. 화사석은 각 면에 무지개 모양의 창을 낸 후, 나머지 공간에 비천상과 이무기를 조각했다.


630여년이나 지난 소중한 문화재
이 석등은 고려 우왕 5년인 1379년에, 보제존자 석종 및 석비와 함께 세워진 작품이다.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630년이나 지난 세월을 지켜 온 귀중한 유물이다. 이 석등은 고려 후기의 대표적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석등을 촬영하다가 화사석을 본다. 그리고 절로 탄성을 지른다. 어찌 이 단단한 돌에 이렇게 섬세한 조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비록 안면은 다 깨어진 것인지 사라졌지만, 그 하나하나가 정말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당장이라도 석등을 박차고 날아오를 것만 같은 부드러움. 천의는 하늘거리며 석등을 벗어나 나부낄 듯하다.



기둥을 타고 오르는 이무기는 또 어떠한가? 금방이라도 비를 만나면 용이되어 하늘로 승천을 할 것만 같다. 8면에 새겨진 비천상 그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특징이 있게 표현이 되었다. 아마 이 석등이 언제인가 그저 하늘로 날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우둔한 생각을 해본다. 그만큼 뛰어난 작품이다.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찾았다. 그리고 석등 앞에서 일일이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한다. 우리들은 그저 무심코 지나쳐버리고 마는 그러한 문화재를, 저들은 이렇게 꼼꼼히 살피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남들도 저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훼손이나 시키고 있다는 것이. 비천상들의 안면이 다 사라진 것을 보면서, 그 부끄러움은 가슴을 아프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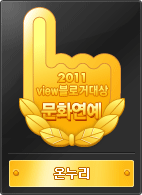
최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