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여류화가의 전시작품에 반하다
‘2018 해움미술관 윤석남 기획초대전’
작가는 올해 80세의 고령이시라고 한다. 윤석남 작가의 작품을 보기 위해 팔달구 매산로 128, 4층에 소재한 해움미술관을 찾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관람료 2000원을 입구 관리자에게 지불하고 전시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에 찌릿해진다. 바로 전시된 설치미술 때문이다.
‘설경(說經)’, 법사가 무(巫)의식에서 경(經)을 읽는 종교 의식을 할 때 굿상 앞에 느려 거는 종이로 만든 경문의 형상을 설경이라고 한다. 설경은 그 자체가 무의식에서 구송되는 경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영력의 힘을 갖는다. 그 설경이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법사는 경문을 독송하고 필요한 무의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30여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무속에 대한 공부를 하고 책을 써온 나로서는 전혀 낯설지 않은 광경이다. 오히려 작가의 설치미술인 설경과 바리데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멀리 떠났던 향제가 돌아온 듯 반가움마저 느낀다. 그동안 수십 수백 번을 보아오던 낯익은 광경이다. 그런 설경을 윤석남 작가의 초대전에서 만난 것이다.
40세에 시작한 윤석남 작가의 작품들
“작가님은 올해 80세예요. 그림을 그리실 때 주로 어머니를 비롯한 여성을 많이 그려요. 자화상이 유난히 많은 것도 작가선생님이 윤두서 자화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얼굴만 그린 작품도 있고요. 작가선생님은 바리데기 이야기를 듣다가 울컥하셨다고 해요. 설치미술에 불경을 형상화 한 것은 모두 바리데기에 나오는 것이죠”
해움미술관 유선욱 큐레이터가 작가의 작품을 설명해 준다. 작가는 한쪽 벽면 전체에 푸른색으로 설치미술을 전시하고 있다. 설경의 조각들을 작품으로 엮어 한 면을 채우고 그 밑에는 푸른색 구슬을 깔아놓았다. 구슬이 깔린 안에는 의자에 앉아있는 바리공주의 형상도 전시해 놓았다.
바리공주는 바리데기라고 해서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가기 전 저승을 잘 갈 수 있도록 천도굿에서 저승길을 열어주는 무의식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말한다. 왕의 일곱째공주로 태어나 버림을 받은 바리데기가 나중에는 무장식한테 시집을 가 부모를 구한다는 무속설화이다. 수십 년 동안 전도굿을 취재할 때마다 수도 없이 들어온 바리공주 설화의 내용이다, 하도 들어 무가의 사설까지 줄줄 외우고 있을 정도이다.
‘말미’라고 하는 바리공주 무가는 천도굿의 끝에 큰 머리를 얹은 무당이 장고를 치면서 한손에는 방울을 들고 거의 한 시간 반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며 무가를 구송한다. 바리데기의 설화는 긴 서사무가로 구성되어진다. 무격(巫覡)이라고 해도 갓 내린 무격들은 바리데기 과정을 행할 수가 없다. 적어도 10년 이상, 록은 그 이상 무의식을 한 다음에야 바리데기 무가를 구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슴 먹먹한 윤석남 초대전
가슴이 먹먹하다. 바리데기 설경이 걸린 것을 본 후부터 아무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보다는 벽에 늘어놓은 조각조각마다 걸린 설경을 찬찬히 훑어보면서 바리데기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억해낸다. 그 안에 무수한 바리데기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긴 무가의 사설을 그대로 벽에 나열한 듯한 윤석남 작가의 초대전. 많은 작품 가운데서도 유난히 눈길을 끈 것은 바로 벽면을 가득채운 설치미술이다.
‘윤석남의 근작은 종이에 그려진 자화상이다. 예민한 먹선으로 형상의 윤곽선을 떠내고 채색을 입힌 그림이다. 두루마리 형식의 프레임 안에 들어간 초상 내지 흉상, 또는 무릎 아래 부분까지 그려낸 경우도 있다. 상당수는 얼굴만이 단독으로 그려진 그림, 그래서 마치 공중부양하고 있는 두상도 있다. 공통적으로 정면을 매섭게 응시하는 눈이 핵심이다.(하략)’
미술평론가 박영택은 윤석남 작가의 작품 평에서 윤석남 작가의 작품의 핵심은 자화상이며 눈이라고 했다. 매섭게 무엇인가를 쏘아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매. 얼핏 굿판에서 접신이 된 무격들의 눈매가 그랬다고 생각 든다. 바로 굿판에서 만난 수많은 눈매를 윤석남 초대전에서 만난 것 같다. 나만의 생각일까? 일정 때문에 오래도록 차분히 감상하지 못하고 돌아서면서 10월 20일까지 전시되는 윤석남 특별 초대전을 반드시 다시 한 번 찾아오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초대전을 찾아가 더 많은 이야길 듣고 싶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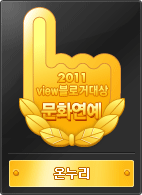
최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