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통민속 굿’ 공연, 과연 전통일까?
수원의 전통 굿 뿌리 찾아내 전승해야
지난 9월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행궁 광장 한편에 가설무대가 설치됐다. 일반적으로 행궁 앞 광장에서 행하던 대형무대와는 달리 크지 않은 무대를 마련한 공연주체는 (사)대한경신연합회 한국민속신문 수원지부에서 주최를 했으며 주관은 수원화성 사도세자 진혼굿연구회 민속분과위원회라고 소개하고 있다.
거창한 단체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날 굿의 주체는 한 마디로 무속인들이다. (사)경신연합회 수원지부가 주최, 주관을 했다고 생각하면 맞을 듯하다. 이들이 이날 무대에 올린 굿은 ‘제14회 수원전통민속 굿 공연’이란 타이틀로 이루어졌다. 매년 한 차례씩 수원에서 굿을 이어가고 있다.
경신연합회 수원지부장인 김영진은 수원전통 굿은 “수원의 발전과 수원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우리전통의 무속제례행사로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고유의 무속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공연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무속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원형보존하여 계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개회사에서 밝혔다.
긴 시간동안 이어 진 굿거리 한마당
오후에 굿이 시작되기 전부터 무대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날은 수원의 세 곳에서 동시에 행사가 열린 날이다. 창룡문 앞에서는 갈라쇼가 벌어졌고,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도 K-Pop의 공연이 있었다. 하지만 굿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그런 공연과는 무관하게 굿을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평균적인 관람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이날 굿의 순서는 초부정(승경숙)으로 시작해 산바라기까지 이어졌으며 제석불사(정우연), 살풀이춤(김애선), 호구대신(유인환), 안택굿보존회 고성주가 이끄는 단체인 경기굿,춤,소리연구원의 출연자들이 신칼대신무, 남도민요, 교방무, 한량무, 노들강변 등의 춤과 남도소리 한마당으로 무대를 꾸몄다.
그리고 이어진 굿거리로 상산, 별상작두거리(한상운), 신장대감(고성주), 창부서낭(승경숙), 뒷전풀이(고성주, 승경숙)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무려 5시간 가까운 긴 시간동안 이어진 이날 수원전통민속 굿 공연은 그 긴 시간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민족은 굿에 대해서는 남다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원전통민속 굿’ 제대로 된 전통 굿 찾아가야
굿은 지역적 특성이 있다. 경기도의 전통굿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굿을 지켜냈다. 과거 재인청의 재인들이 강신무들을 핍박하면서 굿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적이 있다. 재인청은 만일 강신무당들이 굿을 하다 적발되면 굿에서 얻은 비용을 다 빼앗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했다. 일제치하에서는 미신(迷信)이라고 우리 굿을 하지 못하게 하자, 지하에 숨어 악기 대신 키를 긁거나 두드리면서 이어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경신연합회에서 해마다 이어가고 있는 수원전통민속굿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과연 전통민속굿이란 제목을 사용할 만큼 전통인가 하는 점이다. 경기도의 굿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 중인 ‘무당성주기도도차서(巫堂城主祈禱圖次序)‘에 보면 1. 부정푸리 2. 산바라기굿 3. 제석푸리 4. 최영장군혼대거리 5. 대감놀이 6. 별상굿 7. 구눙굿 8. 성주푸리 9. 호구신부혼 10, 창부 11. 말명거리 12. 뒷전의 순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전통굿은 수원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요즈음 무대에 올리는 전통굿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굿거리 제차가 과연 전통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될 만한 것인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말 그대로 지역의 전통적인 무의식을 보존, 전승시키고자 한다면 좀 더 연구를 하고 제대로 된 굿판을 벌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전통은 지켜져야 하지만 굳이 재미있는 공연용 굿이라면 전통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칫 잘못된 곳의 형태가 전통인양 전해질 수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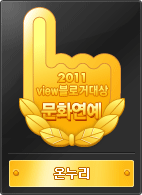
최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