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이 없는 연곡리 석비의 존재는 무엇일까?
이 비는 뛰어난 조각기법이나 그 솜씨로 보아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비를 받치고 있는 받침돌은 거북이의 몸으로 되어있으나, 귀두가 깨어져 나간 것인지 말머리 형상을 하고 있다. 통일신라에서 고려조로 넘어오면서 비를 받치는 귀부는, 대개 몸은 거북이지만 머리는 용머리를 형상화한 것들이 많다. 그런데 연곡리의 귀부는 말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보물 제404호로 지정이 된 연곡리 석비는 비를 받치고 있는 귀부와 몸돌인 비, 그리고 아홉마리의 용을 조각한 머릿돌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 받침돌인 귀부는 등의 무늬는 거북 등의 무늬와 같이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어, 상당히 조각기법이 뛰어나다. 거북이의 앞발은 파손이 되었으며, 머리의 형태는 마치 말머리와 같은 모습이다. 이 귀두가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닌 듯하다. 앞부분이 절단된 듯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귀두는 앞부분이 어떻게 이런 형태로 남아있는 것일까? 그 외에 귀두부분은 용머리 형상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인지는 알수가 없다. 받침돌의 거북은 그 문양들을 볼때 상당히 기능이 뛰어난 장인에 의해서 섬세하게 조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귀두라면, 당연히 중간에 누구가에 의해 훼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다.
비문이 없는 백비, 누구의 비일까?




비의 위에 얹은 머릿돌에는 모두 9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다. 그 용들은 서로 몸을 꼬아 뒤틀고 있는데, 정교한 그 조각은 가히 뛰어난 작품이다. 아홉마리의 용이 서로 여의주를 물기 위해 다투는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듯 뛰어난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연곡리 석비. 도대체 그 비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단 한 자의 기록도 없는 비만을 갖고는 그 주인을 찾을 길이 없어 안타깝다.
말머리에 비문이 없는 백비. 그리고 전체적인 조각기법이 뛰어난 이 비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일부러 비문을 적지 않았는지, 혹은 누군가에 의헤 훼손이 되어 비문이 사라진 것인지 궁금하다. 혹 이 비에 어느 인물의 일대기를 적으려고 마련을 했다가, 갑자기 폐사가 되는 바람에 적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백비로 남아있는 뛰어난 연곡리의 석비는 그렇게 사람의 애간장을 태운다.
천년 세월 제 모습을 지켜 낸 고달사지 부도

여주 고달사지의 동쪽으로 가면 산을 오르는 계단이 있다. 이 돌 계단을 오르면 국보 제4호인 고달사지 부도를 만난다. 이번까지 3번을 이 부도를 보았지만, 볼 때마다 놀라움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고달사지 부도는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팔각원당형의 이 부도는 천년 세월을 제 모습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다.
난 이 고달사지 부도를 만날 때마다 우리 조상들의 예술적 감각에 늘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것은 이 부도가 아직도 완전한 모습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이다. 팔각으로 된 하대석의 연꽃무늬와, 중대석의 용과 구름은 아직도 생생한 모습 그대로다. 중대석의 용은 힘차게 부도를 감고 있다. 용의 무늬 중 불꽃이 타오르는 여의주를 두발로 감싸고 있는 조각은 가히 압권이다. 두 마리의 용이 꼬리를 서로 감고 있는 모습도 생동감이 넘친다. 많은 부도를 보았지만 이런 멋진 조각을 해놓은 것은 그리 많지가 않다.
부도의 전면에 돌출이 된 용의 머리 역시 고려 초기 부도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상대석으로 올라가면 연촉이 표현되어 있으며, 몸돌에는 자물쇠 문양인 문비와 영창이 서로 반대편에 조각이 되어 있다. 자물쇠 문양과 영창 사이에는 사천왕상이 힘있게 조각되어 있다.
머릿돌은 상대적으로 몸돌보다 크게 만들었다. 난 이 고달사지 부도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바로 머릿돌의 밑면에 조각이 된 비천상이다. 금방이라도 승천을 할 것 같은 이 비천상에서 부도는 마무리가 된다는 생각이다. 아마 이 부도를 조각한 공인도, 이 부도의 주인이 하늘로 오르기를 바랐나보다. 또한 스스로도 하늘로 올라 비천인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너무도 생생한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 국보 제4호 고달사지 부도.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고달사지의 제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이 부도는, 고려 광종 대에 전성기를 누리던 고달사가 폐사가 되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인가 보다. 고달사에 남아있는 보물 제7호인 원종대사혜진탑과 비교를 해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국보와 보물의 차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천년 세월 한 자리에 서서 온갖 풍상을 다 이겨내며 제 모습을 지켜 낸 고달사지 부도. 그래서 고달사지를 찾을 때마다 일부러 계단을 오르는 것도, 그러한 아름다운 탑을 보기 위해서다. 더욱 이 부도를 눈여겨보는 것은, 앞으로 또 천년을 그렇게 사람의 발길을 기다리고 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 2009, 1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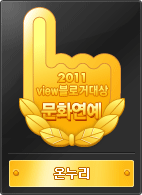
최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