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의견’의 주인인 김개인의 생가지를 가다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에는 ‘김개인의 생가지’가 있다. 김개인은 바로 주인을 구한 개인 ‘오수의견’의 주인이기도 하다. 오수의견에 대한 이야기는 고려시대의 문인인 최자가 1230년에 쓴 『보한집』에 전해지고 있다.
현재 지사면 영천리는 고려시대 거령현에 속해 있었다. 김개인의 집에는 주인을 잘 따르는 충직한 개 한 마리가 있어, 주인은 어딜 가나 그 개를 꼭 데리고 다녔다는 것이다. 어느 날 동네잔치를 다녀오던 김개인은 술에 취해, 그만 길가에 있는 풀밭에 쉬고 있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현재의 상리 부근에 있는 풀밭에 누워서 잠이 든 김개인. 그런데 갑자기 들불이 일어나 무서운 기세를 풀밭을 태우고 있었다. 들불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던 김개인. 들불은 김개인이 잠든 근처까지 번져왔다.
목숨을 버리고 주인을 구한 의견
불이 타고 있는데도 주인이 깨지를 않자. 주인을 따라갔던 개는 근처에 있는 개울로 뛰어들어 몸을 적신 다음, 주인의 곁으로 다가오는 불길을 향해 뛰어들어 뒹굴었다. 그러기를 몇 차례를 했는지 모른다. 결국 주인이 불에 타는 것을 막았지만, 개는 온몸이 불에 그슬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김개인의 생가지가 있는 영천마을 석비와 김개인의 생가지에 조성한 안채
김개인의 집을 돌아보다.
지사면 영천리에 있는 김개인 생가지. 현재 그곳에는 생가지에 재현을 한 집 한 채가 있다. 금산, 장수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생가지의 집. 낮은 돌담을 둘러친 곳 옆에는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돌담 안으로 들어가면 헛간채 한 채와 안채 한 채이 있다. 아마도 옛날 집이야 어떻게 꾸며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옛 모습을 그려내느라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허물어진 벽 볼썽사나워
오수에 있는 의견공원은 몇 차례인가 찾아가 보았다. 아마도 처음으로 찾아간 날이 2006년 8월 31일이었나 보다. 임실군 오수 의견공원 안에 있는 의견비는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이 되어있다. 의견공원을 찾아 가다가 보니, 전주에서 남원으로 내려가는 도로가에 김개인과 의견의 동상이 서 있다. 공원 안에는 오수의견비와 그 앞쪽으로 의견상 등이 있다.


전주에서 남원으로 내여가는 길목에 서 있는 김개인과 의견의 동상과 의견공원(아래) 2006년 8월 31일에 답사를 한 자료이다.


거석문화인 선돌로 빨래판을 삼았다니
선돌은 고인돌과 더불어 대표적인 ‘거석문화(巨石文化)’에 속한다. 선돌은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상당수가 있는데 비해, 많이 분포되어 있지는 않다. 선돌의 분포지역은 함경도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이다. 선돌은 돌을 세웠다는 뜻으로, ‘삿갓바위’나 ‘입암(立岩)’이라고도 부른다.
이 선돌은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구지바위, 수구맥이, 수살맥이, 수살장군, 석장승, 할머니·할아버지 탑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선돌의 형태는 위가 뾰족한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선돌에 구멍을 파거나 줄무늬를 그려 넣기도 한다.

기자속이나 자손창성과 연결이 되
선돌은 그 형태에 따라 암돌과 숫돌로 구분이 된다. 끝이 뾰족한 것은 숫돌이고, 뭉툭한 것은 암돌이다. 이는 이 선돌이 기자속과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선돌에 일곱 개의 구멍을 뚫은 것은 칠성의 믿음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이는 자손창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성혈인 구멍이 뚫린 것은 모두 기자속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선돌은 아들을 바라는 기자믿음으로 보여진다. 선돌은 마을의 어귀나 구릉지대, 논이나 밭 등에 서 있다. 그러한 선돌은 선사시대 신앙물로 이어지면서, 신성한 지역을 알리거나 기자속까지 연결이 된다.

빨래판으로 사용했던 선돌
이 선돌은 연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돌에 새겨진 성혈로 보아 아마도 선사시대의 입석으로 보인다. 이 선돌은 마을 사람들이 냇가에 갖다놓고 빨래판으로도 사용을 하였고, 개울을 건널 때 다리로도 사용을 한 돌이라고 한다. 2009년 까지는 버스정류장 부근에 서 있던 것을 현재의 자리로 옮겨 세웠다고 한다.


성혈의 크기는 직경이 8~10cm 정도에, 깊이가 2~5cm 정도나 된다. 돌의 한편에 나란히 새겨진 이 성혈의 의미를 두고 많은 해석을 하는 것도, 이러한 경우가 거의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빨래판 선돌’이라고 부르는 이 선돌은 아마도 신성한 지역을 알리는 표식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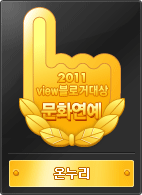
최신 댓글